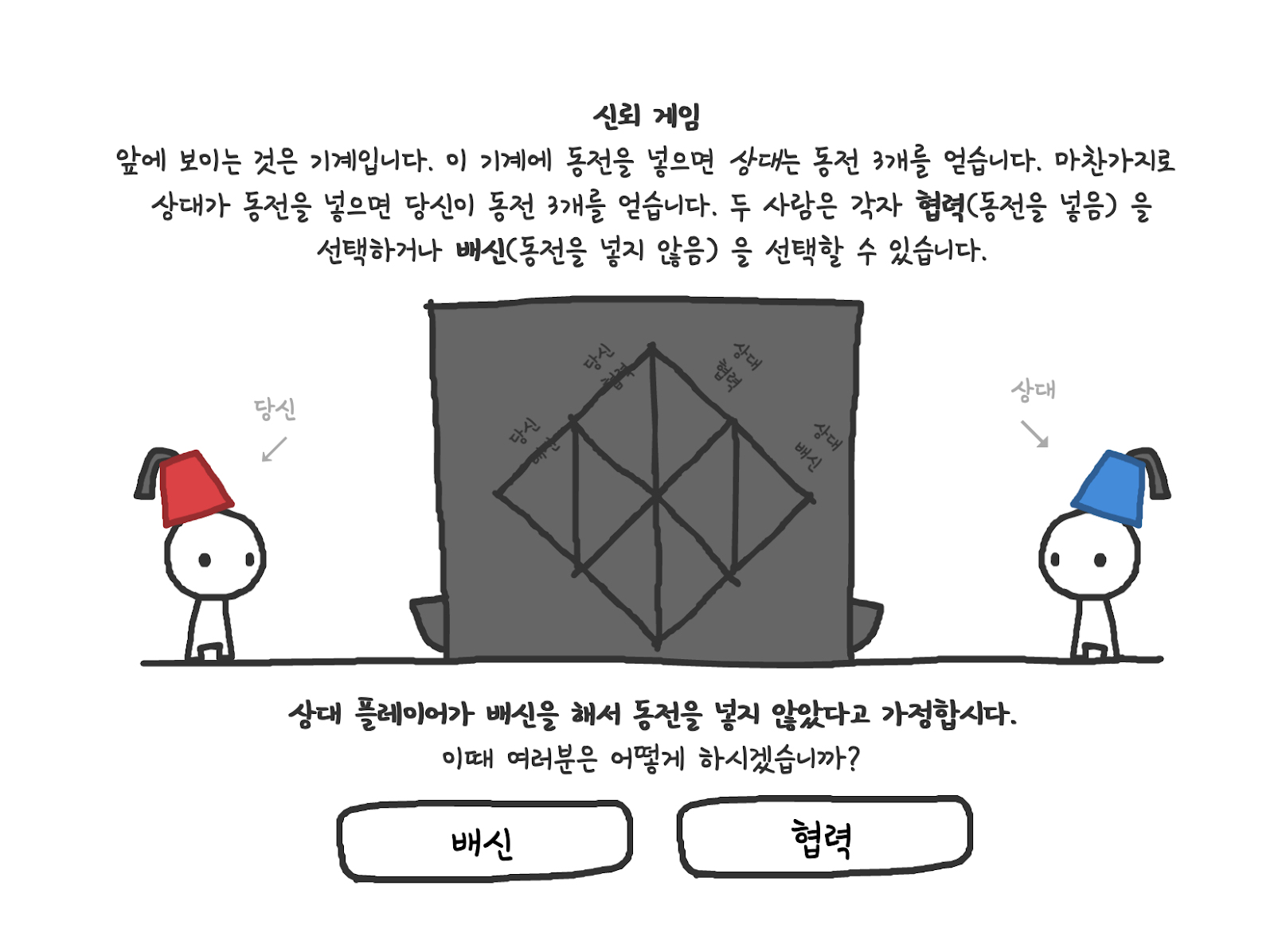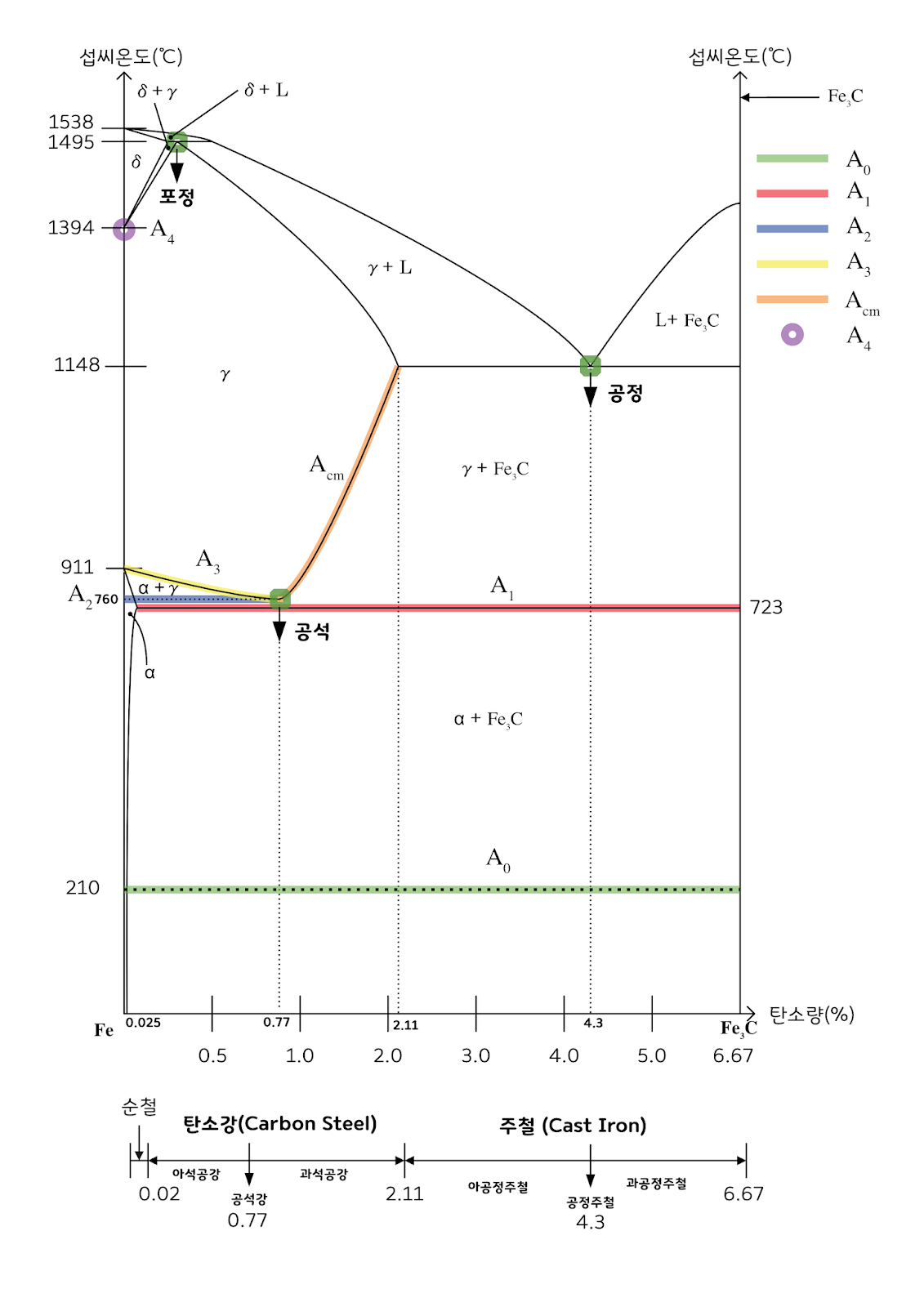가끔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고스란히 느껴봐야한다.
나만 그런 게 아닐 것 같다. 문뜩, 샤워를 하다가 내 수명이 한정되어있고 언젠가는 나도 죽는다는 사실이 머리에 스치는 순간 소스라치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느낀다.
내가 이 경험을 처음 겪었을 때가 9살이였을 때이다.
어느날 친구랑 하교랑 하다가 그 친구가 나에게 이런 말을 건넸다.
“죽으면 어떤 느낌일까?”
그 말을 들을 때에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못해서 그에 대한 대답을 잘 못했다. 내 기억에는 친구에게 “잘 모르겠어.”라고 말했던 것 같다.
그리고 그 날 저녁, 샤워를 하다가 하교할 때 친구의 말이 떠올랐다. 내가 죽으면 어떤 느낌일지 상상을 해보았다.
지금 느끼고 있는 모든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모든 게 무(無)이겠지. 생각도 감각도 기억도 모두 다 사라지겠지.
이런 상상과 생각을 하다보니 그때의 나로서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것이였다. 그 상상을 하고 나는 바로 울어버렸다.
화장실에서 내가 갑자기 펑펑 우니까 거실에 있던 아빠와 엄마가 엄청 놀라셨다.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다독이며 왜 우냐고 물으셨다. 나는 대답했다. “엄마, 아빠 죽으면 어떤 느낌일까?” 그 말을 들은 우리 부모님은 정말 당황하시는 표정을 지으셨다.
그러고 이런 말을 하면서 나를 다독여주셨다.
“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런 생각을 하니. 얼른 그 생각 떨쳐버리고 따뜻한 물 한 모금 마셔라.”
그 때 이후로는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.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걱정끼치드리는 게 싫었다. 또한 내가 느끼기에는 부모님에게도 그 질문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았다.
그 후에도 일 년에 2~3번 9살 때 처음 느꼈던 죽음에 대한 소스라치는 두려움을 느끼곤 했다.
시간이 흐르면서 내 나름대로 그 생각과 두려움을 떨쳐내는 방법들을 만들어냈다. 지금도 물론 그 느낌을 들면 너무나 힘들지만, 삶에 대한 철학과 나만의 가치관들이나 세계관을 최근에 확고한 방향성을 갖게되고 그것들을 어느정도 정리하고 정립하면서 내면으로나 외적으로 자신감이 생겼다.
아마 내가 철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, 수학이나 과학에 흥미를 가지게 된 것도, 아주 작은 뭔가라도 찜찜하면 그것을 파고들면서 분석하려는 습관을 가지게 된 것도, 정치나 역사, 경제, 사회, 문화 그리고 종교 등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다 9살 때의 그 경험 때문이다.
아마 주변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뭔가 답답함을 느낀 것도 사실 나도 잘 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은 사람들의 잣대로 내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하고 내 안에서 머물고 있는 답답함을 풀기위해 바보같지만, 어려운 길들을 선택했다.
왜냐하면, 한번 뿐인 인생이니까.
왜냐하면, 죽으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느끼고, 생각하고,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니까.
왜냐하면, 어느 누군가가 내 인생을 대신할 수 없으니까.
죽음에 대해서 직면하고 고스란히 느껴봐야 또 나에게 많은 도움들을 주고 추억을 준 사람들에 대해 너무나 큰 감사함을 느끼며, 삶의 큰 그림과 이 순간에 대해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.
또한, 수 많은 사람들이 가져다 준 기억과 추억들 덕분에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나날들이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살아있는 이 순간 자체가 기적이고 놀라운 것임을 깨닫게 된다.
쓰러질 것을 알면서도, 질 것임을 알면서도 제대로 내가 가진 것들을 있는 힘껏 부딪쳐봐야 뭐라도 깨닫고 알게 되는 것 같다.
두렵다고, 뭔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한다. 이 뿐만 아니라 그런 태도와 생각은 자신의 삶과 인생에 대한 무책임한 생각이자 행동이라고 생각한다. 자신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본인 스스로 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.